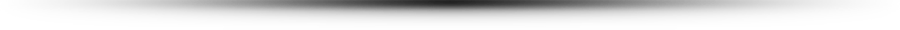[뉴스룸에서-김찬희] 인구절벽, 정말 위기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04 22:05 조회801회 댓글0건본문

#2037년 2월의 어느 날. Z기업의 인사팀장 김 상무는 아침 댓바람부터 바쁘다. 하루 안에 대학 2곳과 고등학교 2곳, 평생교육원 1곳에서 채용설명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리허설 준비로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저희 기업에 맡겨보십시오. 책임지겠습니다.” 준비한 인사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정도로는 눈길을 끌기 힘들다. 김 상무는 연초부터 대학생과 고등학생, 퇴직자를 상대로 부지런히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목표의 3분의 1도 못 채웠다.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출장을 가서 ‘구애’를 해봤지만 결과는 신통찮다. 갈수록 일할 사람이 줄어들다보니 기업마다 ‘인재 쟁탈전’이 치열해서다. “정부에서 이민이라도 대대적으로 받아야지, 이래선 답이 없네.” 김 상무는 혼잣말을 하며 사무실을 나선다.
#생뚱맞아 보이지만 20년 뒤 닥쳐올 현실이다. 통계청이 추계한 2037년 대한민국 인구는 5163만명에 그친다. 이 가운데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3002만명(58.14%)에 불과하다.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0∼14세 유소년 인구가 605만명(11.72%)이라는 것이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면 인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력 공급원인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는 이미 200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인구 급감은 소비와 기업 활동의 위축, 경기침체,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예산 축소, 복지의 질 저하, 대학 구조조정, 국민연금 적자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인구위기’ 혹은 ‘인구절벽’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정말 위기일까. 그동안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 대가로 환경 파괴, 경쟁 심화를 경험했다.
시각을 비틀어 보자. 인구가 줄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공급이 줄어드니 노동력의 평가가치가 높아진다.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는다. 이는 경제규모를 유지하거나 기업 활동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된다. 더는 교통체증에 시달리지 않을 수도 있다. 환경 파괴에 따른 각종 질병, 기후변화의 압박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팍팍한 경쟁도 사라진다. 경쟁을 거쳐야만 좋은 인재, 좋은 기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이미 숱한 해외 사례가 말해주고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파괴적 수준의 인구 감소가 아닌 서서히 적정규모의 인구를 찾아가는 ‘소프트 랜딩’이 이뤄질 때 얘기다. 인구 감소는 거스르기 힘든 흐름이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아쉽다.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다. ‘인구 충격’에 대비해 대대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을 펼칠 것인지, 충격을 줄이는 소프트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디에 손을 대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저출산은 ‘불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소득 불평등(‘노동이 돈을 버는 것’보다 빠른 ‘돈이 돈을 버는 속도’), 임금 불평등(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교육 불평등(사교육과 선행학습 열풍), 일자리 불평등(심각한 청년실업) 등이 ‘애 낳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엉뚱한 곳에 예산을 쓰지 말고 당장 비정규직 차별부터 없애 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조차 쓰기 힘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627만명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5%나 된다.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40.3%다.
김찬희 사회부 차장 chkim@kmib.co.kr